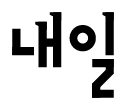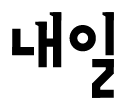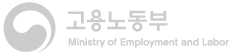옛 직업을 찾어서

4명이 동원되어야 이동 가능했던 가마의 시대가 저물고, 오로지 한 명이 인력거를 끌어 손님을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이동수단이 혁신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두 바퀴 위에 손님을 앉히고 몸소 두 다리로 땅을 지치며 달리던, 가장 땀내나고 역동적인 이동수단. 그 인력거를 이끌었던 인력거꾼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글 이유정]
모던의 상징이자 수단으로 꽃핀 인력거
우리나라의 근대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인력거는 필수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인력거는 근대의 상징이자 이동수단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거의 등장은 고종 31년인 18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 시내와 인천 간 운행을 시작으로 이후 부산이나 평양, 대구 등 지방 도시에서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누빌 수 있는 기동성을 기반으로 하여 여염집 부인, 양반, 대작들과 같은 중산층 사람들의 ‘최신식’ 이동수단으로 금세 자리잡았습니다.
튼튼한 몸이 재산인 인력거꾼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을 읽었다면 알 수 있지만, 주인공 직업인 인력거꾼은 당시 사회적 지위가 낮고
수입도 적은 축에 속했습니다. 튼튼한 몸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이었기에 점차 수요는
늘어만 갔습니다.
1925년 기록에 따르면 인력거꾼의 한 달 수입은 30원가량입니다.
그 30원은 당시 빈민을 정의하고 가르는 기준 금액으로 인력거꾼들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날과 같은 매끄러운 도로사정이 아님을 감안한다고 해도 매일 10~15km에 달하는 거리를 손님들을 태우고
달려야 했으니 육체적 피로감이 엄청났겠지요. 인력거꾼 출신의 육상선수나 마라톤 선수들이 더러 생기기도 했다는
흥미로운 기록도 남아 있지만, 고된 업무 강도 때문에 수명이 길지 않다는 기록도 함께 발견되곤 합니다.
-
인력거꾼들의 끈기와 합심
1911년 1,217대에 불과했던 인력거가 1923년에는 4,647대로 늘어납니다. 1924년에는 김만수라는 인력거꾼을 중심으로 ‘경성차부협회’를 조직하며 3,000명에 달하는 인력거꾼들의 마음을 모아 단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낮은 지위, 박한 사납금 조정도 협회 조직의 이유가 되었지만 인력거꾼의 자제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개인이 매달 20전씩 모아 대동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자제들의 슬기로운 배움터가 될 수 있길 바라는 염원을 담은 이 학교는 현재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대동세무고등학교로 남았습니다.
비록 인력거와 인력거꾼들은 전차와 택시, 버스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등장하는 이동수단에 자리를 내어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삶의 굳센 집념과 미래의 희망적인 씨앗을 뿌린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