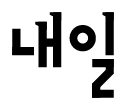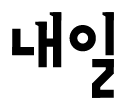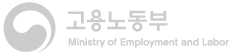옛 직업을 찾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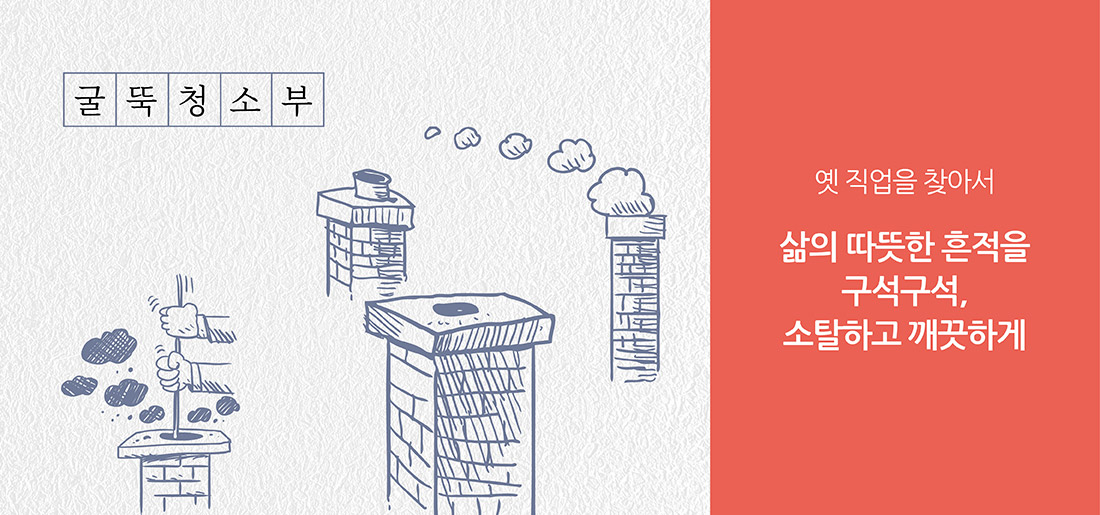
징을 치면서 도심지대의 굴뚝 끄름과 함께 사는 이들에겐 추우면 추울수록 사업이 잘되어 신바람이 날 것 같지만 올겨울은 요즘 같은 추위에 도통 재미를 못 본다고 투덜댄다. (…) 오늘도 골목어귀로 돌아간다
“빨리 봄이 와야지, 꽃 장사라도 하려면…”
― <경향신문> 1958년 1월 22일
시커먼 털복숭이 솔과 기다란 사다리를 등에 짊어진 채 걸어다니며 “뚫어!”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징소리가 나면 겨울임을 알았던 시대였죠.
굴뚝에 끼는 검댕을 매일매일 쑤시고 털어야 했던 사람들, 이제는 한국 직업사전에서 사라진 ‘굴뚝청소부’의 일상이었습니다.
[글 이유정]
징을 울리며 겨울이 왔음을 알린 사람들
1930년 조선 홍보 영상에도 굴뚝청소부는 등장합니다. 겨울이면 거뭇거뭇한 얼굴로 골목 어귀를 돌아다니며 징을 치면 한 집 두 집 문을 열고 굴뚝청소부를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에 이끌리듯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바쁘고요. 집마다 굴뚝이 있어 나무를 때서 취사도 하고 난방도 했던 시절에 굴뚝청소부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주기적으로 굴뚝 청소를 해줘야 불이 잘 들어 방이 따뜻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보일러 배관을 청소하는 직업에 견줄 수 있겠네요.
사실 그 시절 굴뚝청소부들은 요즘 말로 하면 이른바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굴뚝청소부는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농사를 짓다가 추수가 끝나고 추워지기 시작하면 온 가족이 서울로 올라와 굴뚝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오죽하면 “빨리 봄이 와야지, 꽃 장사라도 하려면…”이라고 했을까요. 계절 직업의 애환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산업화의 물결은 흐르고 흘러
굴뚝청소부들의 활약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그 여세를 몰아 굴뚝의 연기도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고도로 발전하고 굴뚝 없는 빌딩들이 생겨나면서 굴뚝청소부들의 일감은 줄어만 갔습니다. 굴뚝청소부의 상징과도 같은 징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이었습니다. 전화가 등장하고 사무실을 차려 굴뚝청소부를 시간에 맞춰 출장 보내는 시스템 도입이 되면서 골목을 채운 징소리는 저절로 잦아들었습니다. 사람의 노동력이 아닌 기계를 사용한 최신식 장비까지 등장하면서 굴뚝청소부들은 점차 일자리를 잃어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