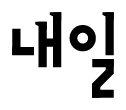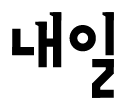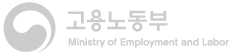옛 직업을 찾아서

[취직전선에 대이상] 전차승무원(차장과 운전수) 모집광고를 하였던바, 모집정원 육십 명에 대하여 칠백칠십 명의 초기록적 응모가 들어와 십대일의 보기 드문 격렬한 경쟁을 일으키었다.
― <동아일보> 1937년 12월 9일
1945년 8월 16일, 서대문형무소의 문이 열리자 그제야 광복을 실감한 사람들이 만세를 외치며 하나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침 “땡, 땡, 땡!” 종소리를 내며 정류장에 들어선 전차는 환희에 찬 시민들을 잔뜩 태우고 퍼레이드를 하듯 움직였지요. 시민들의 발이 되어 기쁜 날도 궂은날도 함께 달렸던 전차, 그리고 전차운전수를 추억해봅니다.
정리 편집부
-
근대 최고의 인기 직업
“전차운전수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사위 삼았습니다.” 전차 전성기를 기억하는 분들의 말씀(출처 <땡땡땡, 전차여 안녕!> 서울역사편찬원 저)에 따르면 당시 전차운전수는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차운전수와 운행을 보조, 관리하는 차장은 모두 정직원이었고 봉급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각이 잘 잡힌 정복과 모자도 한몫을 했고요. 전차운전수는 때로 혼잡한 전차 안에서 벌어지는 소매치기나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청원경찰 역할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문성과 품위를 갖춘 멋진 직업이었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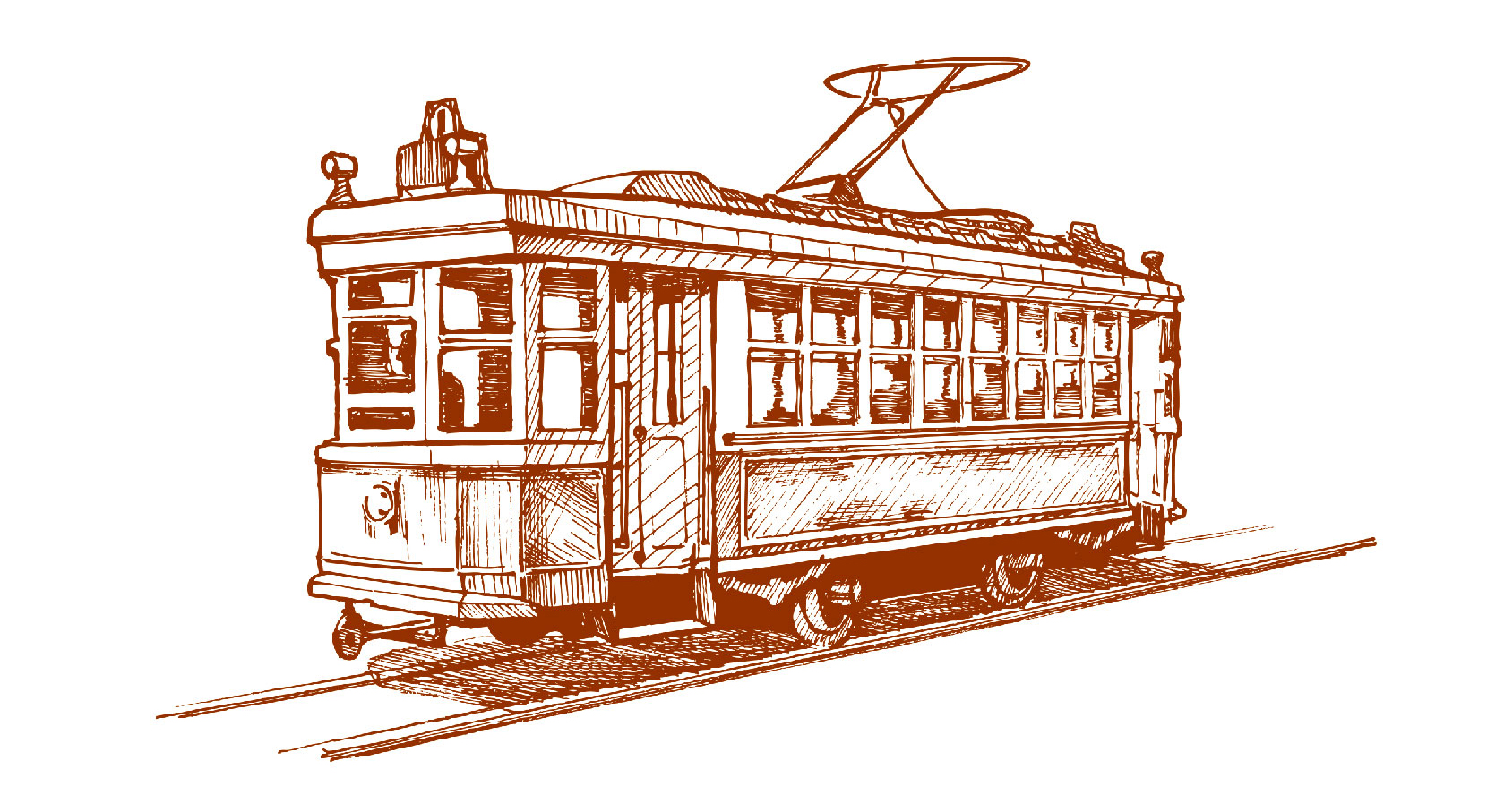
시민들의 발이 되어준 전차
길 위의 궤도를 따라 전기로 달렸던 전차는 조선의 근대화를 바랐던 고종의 기획을 바탕으로 1899년 서울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최초의 노선은 동대문을 출발, 종로를 통과해 서대문까지 돌았습니다. 마차를 끄는 말도, 인력거를 끄는 사람도 없이 시내를 누비는 커다란 전차는 근대식 대중교통이 낯선 시민들에게 신기한 존재였습니다. 전차를 구경하기 위해 일부러 시내에 나온 시민들도 많았지요.
낯설기도 하거니와 승차비가 평균적인 한 끼 식사비를 웃돌았던 전차는 1930년대가 되어서야 전성기를 맞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점점 증가하는데 그때까지도 이렇다 할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선이 확대되었고, 객차 수도 점점 늘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부산에도 전차가 도입됐습니다. 학생들도 할인을 받아 통학 시 이용할 정도로 전차는 시민들의 발이 돼주었습니다.
-
버스와 자동차에 밀려 박물관에 멈춰서다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다치고 깨지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전차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이후 본격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군용차를 개조하거나 커다란 드럼통을 본체 삼아 만든 자동차들이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버스도 등장했습니다. 정해진 궤도와 전선만 따라 움직이는 전차보다 구석구석 누비는 자동차와 버스가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면서 시내 한복판의 도로를 왕복 2차선씩 차지한 전차 궤도는 점점 골칫거리가 됐지요.
정부는 1960년대 후반 전차 운행 중단을 결정합니다. 1968년 서울과 부산에서 마지막 운행을 마친 후, 남아있던 전차운전수들은 시영버스와 공영택시회사에 채용되며 제2의 직업을 찾았습니다. 전차는 비록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시민을 위해 달렸던 전차운전사들의 노고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