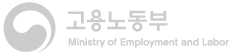옛 직업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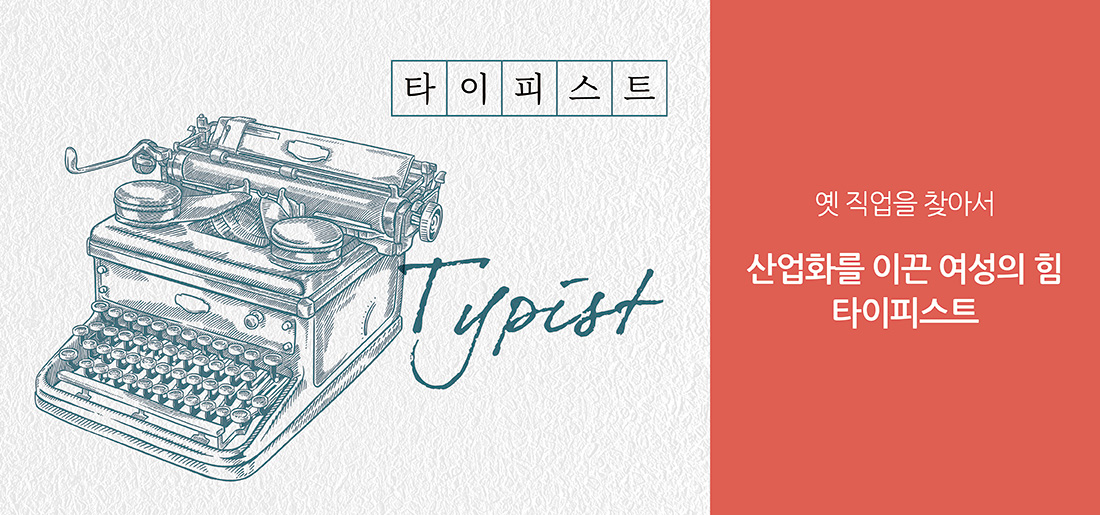
조그마한 기계에 부드러운 손이 어루만지듯 닿으면 ‘리드미칼’한 음향과 함께 깨알 같은 글자가 수 놓이듯 찍히어 가게 마련이다. (…) ‘타이프’를 찍는 기술은 여성의 새로운 기술직업의 하나로서 등장하게 되고 그 기술은 여성에게 좋은 직장을 마련해주게 되었다.
- 1958년 12월 4일 동아일보 -
타닥, 타닥. 경쾌한 소리를 내며 글자를 하나씩 종이에 눌러 담던 타자기를 기억하시나요? 산업화 시대, 타자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다루며 문서 작성을 전문적으로 해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크게 기여한 직업, 타이피스트를 소개합니다.
정리 편집부
다양한 공문서를 작성하던 전문가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았다면 타자기를 두드리던 여성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병사들의 전사 소식을 위로의 말과 함께 가족들에게 보내기 위해 공문서를 작성하던 그들이 타이피스트입니다. 이와 같은 타이피스트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벌식 한글 타자기는 1949년 공병우 박사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타이피스트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해방 직후 미군 부대에서는 타이피스트가 있었다고 하고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타이피스트를 최고의 직업으로 손꼽았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문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타이피스트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력이었습니다.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
1950년대부터 1970년대 타이피스트는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여성 배우자 직업 순위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타이피스트는 타자원 혹은 타자수라고도 불렸는데,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 문서 작성을 위해서는 타이피스트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70년, 서울에만 타이피스트 학원이 50개나 운영되고 있었을 만큼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의 사무능률 향상을 위해 서울상공회의소가 타이피스트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타이피스트들은 1분에 150자에서 200자 정도의 글자를 입력할 수 있었는데, 일류 타이피스트는 1분에 300자의 글자를 입력하기도 했습니다. 비서를 겸직하는 타이피스트들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던 시절, 타이피스트들은 많은 기업에서 일하며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
컴퓨터의 등장과 타자기의 종말
이러한 호황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1981년 발행된 신문 기사에 따르면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이 곧 없어질 것이라 예측했는데, 그것은 이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서 타이피스트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워드프로세스를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문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타자기와 타이피스트의 추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타자기의 경쾌한 소리를 그리워하며 중고 타자기를 수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타이피스트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매력적인 소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텍스트가 금세 탄생하고 소멸되는 요즘, 한 자 한 자 콕콕 짚어가며 제대로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그들을 떠올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