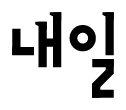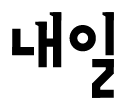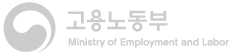옛 직업을 찾아서

바지저고리 입은 물장수가 물지게에 두 초롱의 물을 팔러 새벽의 기와집 골목을 누볐다.
고지대가아니라도 도심에까지 아침저녁 시수는 물장수에 의존한 집이 많았다.
― <경향신문> 1975년 8월 14일
“새벽마다 고요히 꿈길을 밟고 와서 머리맡에 찬물을 쏴- 퍼붓고는 그만 가슴을 디디면서 멀리 사라지는 북청 물장수…” 김동환 시인의 시 <북청 물장수>의 한 구절입니다. 그 옛날 서울에는 새벽마다 물을 길어다 주는 물장수가 있었습니다. 양어깨에 물지게를 메고 찾아오는 물장수 소리에 아침이 오는 걸 아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새벽마다 무겁게 지고 온 물을 붓고 다시 배달하러 묵묵히 떠났던. 그리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아침을 깨우던 물장수. 그들의 삶에 대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정리 편집부
-
물장수의 시작
물장수는 개별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 각 가정에 물을 배달하거나 판매하던 상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수도가 보급되었고 정수기를 설치한 집도 많은데요. 그만큼 물을 접하기가 쉬워져 요즘 사람들에게는 물장수란 직업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수를 구하기 어려웠던 그 시절 물장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직업이었습니다.
물장수는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800년대 초 함경도 사람이 상경하여 맛있는 우물물을 배달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로 함경도에서 온 사람 중에서 물장수가 많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북청 출신이 유명한데 북청 사람들이 자신들의 연고지를 기반으로 담합해 급수권을 주장하며 물장사를 독점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많은 이가 찾았던 물장수
1900년대 초 물장수는 서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1908년도 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서울에서 물장수를 했던 사람은 약 2,000여 명 정도였다고 하니 물장수가 얼마나 필요했던 직업인지 실감이 됩니다. 물장수가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물을 배달해 먹는 가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물을 배달해 먹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우물이 많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식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우물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물의 수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장수에 의존하며 식수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장수들이 많아지자 물장수마다 10~30호씩 단골 구역이 생겨났고 그 지역은 다른 물장수가 침범하지 않는다는 업계의 불문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

-
상수도 보급과 함께 사라지다
물장수들은 약 30리터가 되는 물을 어깨에 지고 다녔습니다. 육체적으로 매우 고된 직업이었죠. 물을 배달하는 물장수뿐만 아니라 물을 지고 다니면서 파는 물장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인원이었지만 모두 똑같은 물장수는 아니었던 거죠. 급수권 때문에 직접 물을 배달하지 않고 물지게꾼을 고용해 물 자릿세만 받는 물장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재력가 중에는 직접 우물을 파서 물장수에게 물을 파는 사람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물장수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다가 점점 하향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점은 수도가 보급되던 때부터입니다.
1908년 수도가 보급되면서 한국상수도회사는 물장수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시내에 공용수도를 설치해 수상조합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상들이 이곳에서 물을 받아 각 가정에 배달하고 물 사용료를 회사에 납부하도록 했죠. 그러다 1914년 일제는 수상조합의 물 사용료 수납이 부실하고 물장수에 의한 급수가 위생상 좋지 않다고 하여 수상조합을 폐지합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온 물장수는 6·25전쟁까지도 존재했지만, 상수도 시설이 널리 보급되면서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물 한 모금이 간절한 여름날, 시원하게 아침을 깨웠던 물장수의 노고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